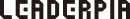일본을 몇 번만 가보면 안다. 오래된 가게가 많다는 것을.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대를 물려 운영하는 가게를 쉽게 볼 수 있다. 이런 곳이 많다 보니 초라하다기보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앞서기도 한다. 왜 일본에는 이렇게 오래된 가게가 많을까? 여전히 대물림하며 그 역사를 이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본에는 유독 오래된 가게가 많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 일본도 호쿠(東北) 지방 5개 현을 취재한 적이 있다. 그중에는 많은 료칸(旅館)도 포함됐는데, 안주인인 오카미상(おかみさん)은 하나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료칸이 얼마나 오래된 곳인지 족보부터 읊었다. 료칸 만이 아니었다. 구경차 들른 전통 나무 인형 고케시(こけし) 가게 주인도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역사와 전통부터 쏟아냈다. 식당도 예외는 아니었다.
취재에 동행한 현지 가이드는, 일본에서는 ‘3대째 하는 집이 아니면 요리도 아니라는 말이 있다’고 했다. 한 세대가 20~30년 정도 운영 했다면 60~90년간 식당을 운영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트렌디 한 식당도 많지만 오래된 식당을 으뜸으로 꼽는 모습은 세대를 불문 하고 여전하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오래된 가게를 ‘시니세(しにせ)’라 고 한다. 우리가 요즘 많이 사용하는 ‘노포(老鋪)’라는 단어도 이 일본어에서 유래했다.
취재 중 만난 한 식당의 주인은 가게 역사가 100년이 넘어도 특별한 대접을 받지는 못한다고 했다. 의아해 되물었더니 고객은 그냥 오래 된 가게 정도라고, 어느 정도 기본은 갖춘 가게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100년 이상 된 가게가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가이드도 말을 보탰다. 지방 소도시에 사는 그는 자신의 집 주변에 있는 상당히 많은 가게가 그렇다고 했다. 오래된 가게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듣고 나니 놀랍긴 했다.
전 세계 200년 넘은 회사의 54%
2018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한국장수기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에 의하면 100년 이상된 전통 기업은 3만3069개나 된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100~200년 된 기업은 3만1136개, 200~300 년 된 기업은 822개, 300~400년 된 기업은 639개다. <블룸버그>의 2019년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200년이 넘은 회사 8785개 중 3937 개가 일본에 있다. 전체의 44.8%를 차지하는 것이다.
일본에는 1000년 이상 된 가게도 여러 곳 있다. 그중 578년에 창립 된 사찰과 신사, 불각 건축의 설계와 시공, 성곽과 문화재 건축물을 복원하고 수리하는 일을 주업으로 하는 건설 회사 곤고구미(金剛組, こんごうぐみ)가 있다. 경영난으로 1429년 역사를 끝으로 2006년에 파산한 후 다카마쓰 건설에 인수되자 많은 일본인이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역사와 전통을 중시하는 일본인에게 그 아쉬움은 한숨이 었을 것이다.
여행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한 후배는 후지산 인근 야마나시 현에 있는 ‘게이운칸(慶雲館, について)’이라는 여관 얘기를 했었다. 들어가는 길부터 압권이었다는 그곳은 705년에 지어져 역사가 무려 1300 년이 넘는다고 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숙박업소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다는 그곳은 무려 52대에 걸쳐 가업 경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아마 이곳의 오카미상을 만나면 가장 먼저 족보부터 읊었을 것 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매일경제> 2019년 기사에 따르면 100년 기업은 8개다. 그중 가장 오래된 기업은 어디일까? 1896년에 설립 된 포목 가게 ‘박승직상점’이다. 지금의 두산이다. 그다음은 동화약품과 신한은행(1889년), 우리은행(1899년), 몽고식품(1905년), 광장(1911년), 보진재(1912년), 성창기업(1916년)이다.

한국은 한(韓), 일본은 와(和)
일본에는 왜 유독 오래된 가게가 많을까? 장인 정신 등등을 운운하며 역사와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일본 특유의 문화 때문일 것이라는 어림짐작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 역사와 전통을 중시하는 문화는 왜 생겼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심은 아마도 1400년 동안 일본의 정신 문화를 지배해온 ‘화(和)’ 문화 때문일 것이다. 일본어로는 ‘와(わ)’로 발음하는 ‘화’. 사전적 의미는 ‘서로 뜻이 맞아 사이가 좋은 상태’다. 화목하다, 온화하다에 쓰이는 바로 그 뜻.
우리나라 사람에게 ‘한(韓)’이 친근하듯 일본인에게 ‘와(和)’는 무척이나 익숙한 단어다. 우리는 우리 옷을 한복이라 부른다. 일본 사람들은 전통 의복을 와후쿠(和服, わふく)라고 한다. 우리가 우리 음식을 한식이라고 하듯 그들은 자신들 음식을 와쇼쿠(和食, わしょく)라고 한다. 우리가 우리 전통 과자를 한과(漢菓)라 부르듯 일본 사람들은 일본 과자를 와가시(和菓子, わがし)라고 한다. 우리나라 사람에게 ‘한’ 자체가 우리나라이듯 일본 사람에게 ‘와’는 그 자체가 일본이다.
사이좋게 지낸다는 미명의 억압
그렇다면 이 ‘사이좋게 지낸다’는 뜻의 ‘와’는 어떻게 일본의 정신문화가 되었을까? 사이좋게 지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대에 대한 인정과 존중에서 비롯된다. 즉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분수에 맞게 자기가 해야 할 일만 하는 것이다. 이게 ‘와’의 기본이다.
우리나라가 그렇듯, 그리고 오랜 역사를 지닌 많은 나라가 그렇듯 일본에도 예전에는 신분 계급이 있었다. 최상위 계급은 천왕이다. 그 밑에는 천왕을 보좌하는 귀족이 있었다. 귀족 주변에는 귀족의 권위를 지켜주는 사무라이가 있었고, 그 아래에는 농·공·상민과 천민이 있었다.
각 계급에 ‘와’를 적용하면, 천왕은 천왕의 일을, 귀족은 귀족의 일을, 사무라이는 사무라이의 일을, 농·공·상민과 천민은 각자 자기 일만 하면 서로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간단하다. 천왕과 귀족은 하위 계급이 각자의 신분에 맞는 일을 정하고, 복종하게 하는 것 이다. 물론 이 시스템에서 자율은 없다. 개성이나 의견 따위도 없다. 그냥 정해진 시스템에 맞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사이좋게 지내기 위한 명목이었지만 무척이나 경직된 제도였다. 이 시스템은 여러 장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각인시키고, 스스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견고하게 유지되었다. 신분에 따라 입는 옷도 달랐다. 사는 집도 달랐다. 먹는 음식도 달랐다. 심지어 대문에 자신의 계급과 직업을 밝히는 문패까지 걸어야 했다. 이런 시스템은 길거리에서 보는 모습만으로도 신분을 확실하게 구분하게 했고, 때문에 자신의 신분과 해야 할 일 외에 다른 것은 쳐다볼 엄두도 낼 수 없었다. 혹시라도 이 시스템을 어기는 자는 시스템 유지를 위해 가차 없이 제거 되었다. 물론 이것은 사무라이의 몫이었다. 그건 사무라이가 해야 할 일이기도 했다.

자기 분수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기본
‘와’ 사상은 누가 만들었을까? 창시자는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 스이코 천황 시절에 활약한 일본의 섭정이자 정치가이며, 유명한 불자 인 쇼토쿠 태자(聖德太子)다. 백제의 혜총과 고구려의 혜자를 스승으 로 모시고 유교와 불교를 배운 그는 고대 일본의 정치체제를 확립한 인물로 꼽힌다. 그는 ‘청원자 10명이 동시에 꺼낸 말을 정확하게 알 아듣고 적절한 답변을 했다’는 일화가 있는데, 이 때문에 일본의 드 라마나 만화, 영화 같은 매체에서는 여러 명이 시끄럽게 떠들면 “내가 쇼토쿠 태자냐?”라고 불평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와’ 사상의 영향으로 일본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이주의 자유가 없었다. 가장 높은 천왕 밑에는 천왕을 모시는, 일본의 역대 무신 정권인 막부의 수장 쇼군(將軍)이 있었다. 그리고 지방에는 영주인 다이묘 (大名)를 두어 각 지역을 다스리게 했다. 다이묘는 해당 지역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했다. 다이묘가 지배하는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곳에서 죽어야 했다. 이렇게 한정된 지역에서 사이좋게 지내기 위 해서는 자신의 역할에만 충실하며 상대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것은 자신의 영역을 보장받는 일이기도 했다. 타인의 영역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반란이며, 자신의 행동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했다.
예를 들어, 우동 가게를 운영하는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대를 이어 우동을 만들어야 했다. 매출을 늘리기 위해 길 건너편에 우동 가게를 하나 더 낸다면 그것은 타인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다. 결국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운이 좋으면 집단 왕따인 이지메를 당하지 만 대부분 무라하치부(村八分)를 당하게 된다. 무라하치부는 에도 시대에 촌락 공동체 안에서 규칙과 질서를 어긴 자에 대해 집단이 가하는 제재 행위다. 지역의 모든 사람이 그 가족 전체를 투명인간 취급 하는 것이다. 이주의 자유가 없으니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한다. 말도 시키지 않고, 질문에 답하지도 않는다. 지역의 어떤 일에도 끼워주지 않는다. 평생 외로움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다.
무라하치부로 끝난다면 그나마 운이 좋은 것일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일이 커지면 사무라이가 나선다. 사무라이는 질서유지를 명목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일반 백성을 죽여도 벌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 질서를 깨뜨린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 그것은 사무라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당연한 것이었다. 안전하고 평온한 삶을 살기 위 해서는 자신의 분수에 맞게 정해진 위치에서 주어진 일만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었다.
정신문화는 한순간에 끝나지 않는다. 이런 영향으로 한자리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며, 전수한 비법과 운영 노하우는 자연스럽게 단골을 만든다. 부모님의 손을 잡고 다니던 자녀도 자연스럽게 단골이 된다. 그렇게 또 대를 잇는다. 오래된, 작은 규모의 가게라 하더라도 이런 문화로 인해 폐업할 확률은 낮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고스란히 자부심으로 또 대물림된다.
사이좋게 지낸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하다. 1400년 넘게 일본을 지배하는 ‘와’는 일본 정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정말 사이좋게만 지내고 있을까? 일본의 수도 도쿄 한복판에서는 여전히 혐한 시위를 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도쿄만 그런 것이 아니다. 커다란 스피커를 달고 큰 소리로 혐한 방송을 하며 다니는 모습을 보면 그들 특유의 ‘와’ 문화는 찾아볼 수 없고,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분란을 조장 하나 싶다.
영토 분쟁도 마찬가지다. 중국과는 센카쿠(尖閣) 열도 영유권을 둘러 싸고 중국이 일본을 점령했다고 하고, 러시아와는 러시아가 쿠릴 열도 4개 섬을 제2차 세계대전 때 빼앗았다고 하고 있다. 타국에 대한 이슈는 논외로 하더라도 명확한 역사적 근거가 있음에도 독도를 일본 땅이라 지속적으로 우기고,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를 왜곡하는 것도 부족해 사도 광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려는 움직임을 보면 그들의 ‘와’ 사상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